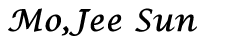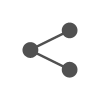월광소나타(上) - 모지선의 '그림이 있는 수필'
작성자
mojeesun
작성일
2016-03-03 18:16
조회
2016

월광 소나타 (上)
부산에 살던 중학교 시절, 나는 두 가지 과외를 받았다. 하나는 영어-수학이었고, 또 하나는 피아노였다.
영-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서울에서 s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그 당시 1960년대엔 대학을 졸업했다고 바로 취직이 되는 시절이 아니어서 요새말로 잠시 ‘백수’로 있는 동안 궁여지책으로 가정교사 자리를 택하신 것 같았다. 그 선생님의 소개로 온 피아노 선생님 역시 같은 대학의 음대 작곡과를 나온 실력파로 언니와 나의 피아노를 가르치셨다.
영-수 선생님은 시골 출신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나 보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엔 철이 없어 가난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자주 양말을 신지 않고 오거나 구멍 난 양말을 신고 오셨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얼굴이 아주 검고 커다란 눈에 유난히 흰 동자가 많았고 여드름이 많이 나셨지만 마음씨가 매우 착하셨고 항상 웃는 얼굴이셨다.?
나는 그런 선생님을 자주 골탕 먹였다. 겨우 학교에 갔다 와서 신나게 놀라치면 어김없이 “지선!”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집에 오시니 미운 마음이 솟구쳤다. 더운 여름엔 선생님은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수를 좋아하셨다.?
나는 그 점에 착안해서 몹시 더운 날 얼음물에 설탕 대신 소금을 잔뜩 타서 유리잔에 가득 갖다드리니 단숨에 들이키셨다. 다 마신 다음에야 소금인 줄 알고 “짜다”고 기침을 하고 캭캭거리며 인상을 쓰셨다. 나는 박장대소를 했지만 겁이 났다.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하고…. 그러나 선생님은 화는 커녕 웃으시며 “지선이는 참 장난이 심해” 하는 정도로 끝냈다.
당시엔 한창 외국학생과의 펜팔이 유행이었다. 나도 미국 여학생하고 펜팔을 했는데 그 편지를 바쁘다는 핑계로 모두 선생님에게 시켰다. 어느 날 선생님은 실수로 사귀던 시골 애인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를 펜팔편지와 혼동해 나에게 주셨는데 그 편지를 식구들과 선생님이랑 밥을 먹는 자리에서 소리내 읽어 내려갔다. 선생님은 무척 당황해 하면서 나에게서 편지를 뺏으려 하셨다. 그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하시던 모습. 아! 나는 그때 왜 그랬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착한 편이었는데 왜 유독 그 선생님에게만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지 3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아파온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재미있는 나의 장난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친구인 피아노 선생님이셨다. 피아노 선생님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의 명성에 어울리게 늘 흰 와이셔츠에 금테 안경을 쓰고 깨끗한 피부에 희고 긴 손가락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다. 잘 웃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말이 없으시고 조금이라도 연습을 게을리 했을 경우엔 화를 내며 가는 작대기로 손가락을 아프게 때리셨다. 부모님은 두 선생님을 명문대의 우수한 졸업생이라며 깍듯이 대하셨다. 공부할 때나 피아노 레슨을 할 때는 맛있는 음식만을 챙겨드리고는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야단치는 것도 묵인하셨다. 아무튼 나는 깔끔한 성격에 카리스마 넘치는 피아노 선생님을 무척 어려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슨이 끝날 무렵 피아노 선생님이 나를 낮은 톤으로 부르셨다. 나는 몹시 긴장했다. 긴 침묵 끝에 “지선이가 김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힌다지? 나는 지선이가 그런 학생인줄 몰랐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치사하게 피아노 선생님에게 다 일러바쳤구나’라며 억울해 하고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 선생님을 골탕 먹인 일을 생각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피아노 선생님 한테는 그야 말로 착실하고 말 잘 듣는 제자였다. 소위 ‘이중인격자’였던 셈이다. 그 때 정전이 됐다. 그 당시 1960년대는 밤 9시 이후에 가끔 정전이 됐다. 그러면 집안에서 석유등을 피워 방마다 밝혔다. 요즈음은 골동품 가게에나 있을 법한 심지를 올리고 성냥으로 불을 켜는 빨간 남포 등불을.?
누군가 등을 켜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야단을 맞고 있지만 않았다면 엄마를 부르며 “등불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뛰었겠지만….
웬일인지 등불은 빨리 들어오지 않고 시간이 흐르니 피아노 방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때가 보름이었는지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때였다. 선생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흰 손을 천천히 피아노 위로 올렸다. 그리곤 연주를 시작했다.
‘월광 소나타’였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1악장!
하얀 와이셔츠에 푸른 달빛을 받으며 길고 흰 손가락이 피아노 위를 거니는 모습, 반듯한 이마에 곧은 콧날의 옆얼굴, 지그시 눈을 감고 천천히 윗몸을 앞뒤로 흔드시며 한 손은 허공 위에서 천천히 내려와 건반 위를 거니는 ‘월광 소나타’ 1악장의 감동은 지금도 그 장면 하나 하나가 내 가슴에 오롯이 살아있다.
‘월광 소나타’는 달빛을 타고 흐르고, 나의 양심은 선생님의 피아노 음률을 타고…. 나는 어두운 방에서 감동인지 참회인지 모를 눈물을 흘렸다.?<계속>
코스모스팜 소셜댓글